미래의 날씨,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기예보 속 과학

어느 때부턴가 여름만 되면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기상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드물던 일들이 이제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이제 기후 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2021년 노벨 물리학상에는 기후와 관련한 기술들에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지구과학 분야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1995년 오존층 파괴 과정을 밝힌 연구자들뿐이었고, 정통 기상학을 전공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였습니다. 기후과학 연구는 이제 물리학 분야 핵심 주제로 주목받게 되었지요.
이날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지구 기후 모델의 토대를 마련한 미국 기상학자 마나베 슈쿠로(Syukuro Manabe, 90세)와 날씨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기후 예측의 신뢰성을 제시한 독일 해양학자 클클라우스 하셀만(Klaus Hasselmann, 90세), 무질서한 복잡계에 숨은 규칙성을 찾아낸 이탈리아 이론물리학자 조르조 파리시(Giorgio Parisi, 73세)였습니다. 백전노장들이 이룬 쾌거였지요.

현대 기후 모델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나베 슈쿠로 교수는 1960년대 후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가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약 2℃ 상승한다는 정량적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복사 평형, 대류, 지표와 대기 간 에너지 흐름 등을 수치적으로 계산한 세계 최초의 기후 모델로, 이후 그는 3차원 기후 모델을 개발해 북극 지역의 온도 상승, 성층권 냉각 등 현재 관측되고 있는 복잡한 기후 현상을 예측해냈습니다.

그의 연구, 즉, 컴퓨터 기반의 물리적 모델링 접근법은 오늘날 한국 기상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장기 예보 모델, 그리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정책 시뮬레이션에도 기반이 되고 있지요. 기후 모델의 기틀을 세운 마나베 슈쿠로 덕분에 우리는 외출할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부터 장마철 수위 예측, 전력 수요 예보, 항공기의 기상 회피 항로 설정 등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 존재하는 규칙을 찾아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한 과학자도 있습니다. 클라우스 하셀만 박사입니다. 물리학과 수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십분 활용하여 1905년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으로 날씨와 기후 변화의 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날씨는 단기적이고 변화무쌍하며 혼란스럽지만, 이러한 날씨 변동성이 축적되면 예측 가능한 기후 변동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여러 요인이 만들어 낸 기후 변화 신호에서 각각의 인자들이 끼친 영향을 구별할 수 있는 지문법(fingerprint approach)을 개발해 인간 활동과 자연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를 구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인위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에 대해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셀만은 날씨의 불확실성을 ‘잡음(noise)’의 개념으로 놓고, 장기적인 평균 경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그 속에서 시그널을 뽑아냈습니다. 즉, 매일 달라지는 날씨를 잡음이 가득한 신호로 보고, 이로부터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기후 변화의 신호를 추출해냅니다. 거기에 외부 인자로 ‘인류의 영향’을 추가해보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조르조 파리시 교수는 기후학자는 아니지만, 물리학 분야에서 오랜 시간 ‘복잡계(complex system)’를 연구해 온 석학으로, 그는 복잡계의 질서를 해석해냈지요. 그는 이전에 무질서한 자성체(스핀글라스)의 구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수학적으로 규명하였는데, 이는 날씨, 기후, 생물 생태계 등 수많은 요소가 얽힌 시스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기후 역시 복잡계의 전형적인 예로, 바람, 바다, 태양 복사, 지표면, 대기 등이 서로 얽혀 만들어진 기후 시스템은 예측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파리시의 복잡계 이론에 따라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AI 기후예측 기술의 이론적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기도 하지요.

이들 세 과학자의 연구는 기후 변화를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적 현상의 차원에서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무질서한 자연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기후 과학의 진보를 넘어, 그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물리학의 영역으로 지평을 넓힌 것이고, 이는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마나베 슈쿠로는 기후 변화의 기초 모델을 세웠고, 하셀만은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파리시는 복잡한 데이터 속 숨겨진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AI 기반 기상예보, 기후 변화 분석, 재난 대응 등 오늘날 우리가 날씨와 기후를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이들의 연구를 통해 ‘과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가’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한 줄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수십 년의 과학적 노력과 모델링, 시뮬레이션, 데이터 해석의 결과물임을 알게 됐으니, 이제 뉴스 끝 즈음에 기상 캐스터가 전하는 일기예보가 허투루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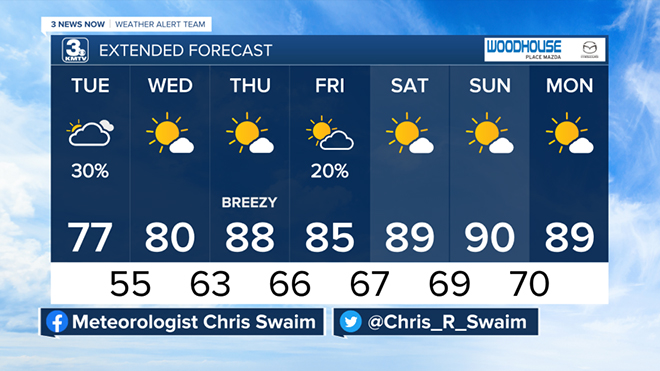
'Semiconductor > 스마트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랩] 남의 땅을 오래 쓰면 내 땅이 될 수 있다? (1) | 2025.10.15 |
|---|---|
| [디지털 라이프] 찬란한 가을의 대명사, 낭만과 추억이 IT와 조우하면? (0) | 2025.10.10 |
| [부동산 랩] 부동산 대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DSR·LTV·DTI 입문 (1) | 2025.09.08 |
| [디지털 라이프] 지글지글 HOT한 여름, 시원시원 COOL한 냉각기술 (9) | 2025.08.08 |
| [부동산 랩]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매매 핵심 포인트 (8) | 2025.08.06 |



